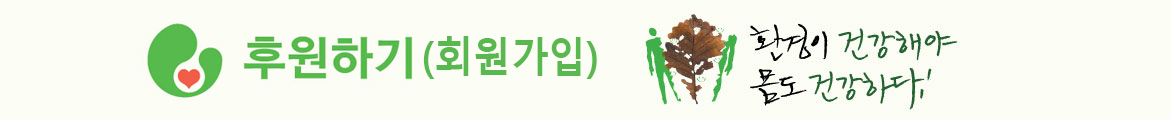자연환경문학의 금자탑 '한스푼'
자연환경문학의 금자탑 '한스푼'
[서평] 비소설 자연수상록 ‘한 스푼’
-엄혹한 시대 마르고 질식한 이들에게 건네는 산소 한 모금-
-갈급한 시대 목마른 이들 곁에 내놓는 생수 한 사발-
* ‘평범한 자연 속에 숨어있는 참세상’ 우리네 인간과 불가분 밀접하면서도 무심하기 마련인 생명력의 근원 대자연, 그 막강한 치유력을 몸소 체험하며 몇 방울의 땀, 때론 눈물, 혹간 육골즙으로 토혈해낸 자연수상록입니다.
* 친환경 생명의식이 각별하게 여겨지는 이즈음 어지러운 시속을 떠나 도정을 걷는 심정으로 대자연 속에 사는 동안 치열하고도 진지한 일련의 사유를 통해 모태 대자연의 진면목을 발굴 드러내고자 함에, 우리 인간들 지상에서의 존재론적 의미와 함께 무수 생명가치와 순종적으로 공존 공생해야만 하는 명료한 이유가 본 자연수상록 문장에 함유되어있습니다.
* 인도주의 지표로서 흔들림 없는 참 가치, 생명진정성에 깊이 목말라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내미는 생수 한 그릇, 산소 한 모금이고자 소망합니다.
* 자연은 인간을 치유 성장시키고 인간은 자연을 보호 숭상하기로 화해와 상생의 전도사임을 자청하며,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항상 소용되는 문장과 필자가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즘의 각박한 시속의 세태에 곁에서 내미는 산소 또는 생수 같은 역할을 기대하거니와, 일반적으로 말하듯 잘 쓰기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감흥 깊은 글, 나아가 깨우침을 나눌 수 있는 깊은 내용이고자 합니다. (저자의 말)
**
강원도 양양 산 속에서 시속과의 인연을 멀리하려 깊게 칩거해도 쉬이 저물지 않는 탐욕, 자기양심과의 치열한 투쟁을 작가는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 있으니, 이제껏 읽어본 중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기도문이자 필생의 화두로 삼았다.
“내가 날 용서할 수 없다는데 누구에게서 감히 화해와 용서를 구할 것인가, 그래서 천리번뇌 끝에 허허롭게 올리는 내 짧은 속기도의 결말은 늘 이렇다.”
“살아있을 동안은 긍휼(矜恤)히 여기실지언정 끝끝내 용서친 마옵소서,
멀리 돌아서 갈 뿐 다가가지도 두드리지도 않을 천국의 문은 그냥 닫아두소서, 그래야 내 속이 편하나이다.“ (182쪽)
문장과 사진뿐 아니다. 작가는 기발한 발상을 동원해 자연에 흐르는 계절의 소리들을 채록,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봄여름을 주제로 감동 가득한 음향파일(8분여)도 만들었다. 출판사 ‘어문학사’ 홈페이지에서 누구든 자유롭게 듣고 내려 받을 수 있다. (www.amhbook.com)
**
다람쥐 때문에 밤 못 줍고, 개구리 때문에 길 못 가고…자연은 우리에게 뭘까, 도시의 세파에 시달리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시골에서 살아 봤으면”하는 꿈을 꾸었을 것이다. 짧은 여름휴가나 여행을 통해 겉핥기로 자연을 맛보기라도 한다면 자연에 대한 아쉬움은 더욱 깊어진다.
그렇다면 몇 년쯤 인적 드문 산속에 작은 집을 지어놓고 홀로 텃밭을 일구며 자연을 생각하며 글 쓰는 생활을 하면 어떨까, 막상 실천에 옮기려면 쉽지 않은 이런 결단을 내려 강원도 양양의 산골짝에 숨어든 수필가 고충녕 씨가 6년여 동안의 사색의 결과물을 내놓았다.
“차 한 잔 한숨 한 스푼, 술 한 잔 눈물 한 스푼”이란 부제가 달려있는 자연수상록 <한 스푼>을 읽노라면 자연으로 들어가려면 벗어놓아야 할 것이 많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된다. 물건에 대한 욕심은 그 하나이다.
알밤에 관한 이런 일화가 있다. 자신의 밤이지만 그는 다람쥐가 겨울 식량으로 모두 비축한 다음에야 알밤을 조금 챙기는 소심한 농부이다. 그런데 오지에도 밤을 따가려는 사람이 종종 나타난다.
“창밖에서 부르릉거리던 차량 엔진 소리가 이유도 없이 뚝 멈추거나 인적이 언뜻거리면 난 상황을 쉽게 짐작하고 천천히 채비를 한다.”(14~15쪽)
이런 상황이 닥치면 그는 미리 골라둔 알밤 한 되 가량을 비닐봉지에 담아 서리꾼을 맞는다. 두 명이면 두 봉지, 세 명이면 세 봉지. 소리 지르고 욕하는 것보다 이 방법이 그들의 양심을 되찾게 하는 지름길임을 그는 번번이 확인한다.
*
자연보전을 둘러싼 갈등이 심하다. 자연은 종종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된다. 악착같이 파괴하려 하고 결사적으로 지키려는 갈등이 적지 않게 일어난다. 이때 자연은 무슨 신앙처럼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이거나 아무런 화폐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처럼 취급받는다. 그가 한 농부와 벌인 어느 ‘갈등’에서 해법의 단서를 찾는다.
그는 개구리 울음소리를 좋아한다. 그래서 봄이면 논에서 꼬물거리는 올챙이를 관심 있게 들여다본다. 그 논은 ‘이 서방’이란 농부의 것이다. 어느 여름, 그의 올챙이는 논에서 떼죽음할 처지에 놓였다. 계곡물 유입을 막아 논의 온도를 높여야 벼가 잘 자란다는 농부 이 서방의 오랜 경험에 따라 산에서 유입되는 물길을 막아놓았기 때문이다. 그는 급한 김에 물길을 막은 돌멩이를 치워 올챙이를 살렸지만 오래지 않아 이 서방은 물길을 다시 막는 일이 벌어졌다. 이 ‘환경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살고 죽는 게 자연계의 엄연한 흐름일지라도 죽음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일단 산목숨은 구하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과 “농부들에게 제 논에 물대기는 제 몸의 피돌기와 같은 생리적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맞부닥쳤다.
‘은밀하게 물길을 뚫어야 하나?’ 고민하던 그에게 뜻밖의 간단한 해결책을 이 서방이 실행에 옮겼다. 그는 주먹 만한 돌 대신 그 절반 크기의 돌로 물길을 막아 올챙이가 살면서도 벼의 활착도 막지 않는 해결책을 찾아낸 것이다.
여기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0과 1, ‘이다’와 ‘아니다’로 세상을 가리는 디지털 세상에 물들었는지를 깨달았다. 이 서방에겐 따스한 ‘아날로그 방식’이 살아있었던 것이다.
*
자연에 대한 섬세한 감수성을 지니고 시골에서 살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반딧불이를 볼 기대에 부풀었던 논에 어느 날 농부가 덜컥 농약을 치는 일이야 어쩔 수 없다고 치자. 하지만 비오는 어느 날 바다를 보고 싶어 나선 트럭 앞 도로에 줄지어 늘어선 개구리를 본 그는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되돌려야 했다. 이런 화풀이와 함께…….
“참고 참은 끝에 오늘, 한가로울 줄만 알았던 오늘이 하필이면 개구리 장날, 망할 녀석 개구리 놈들은 부디 잘 먹고 잘 살아라!”(147쪽)
산골 생활은 외롭다. 그래서 그는 내면의 또 다른 자기와 종종 대화를 나눈다.
“소나무가 왜 늘 푸른지 알아?”
“바람이 불면 바늘잎 서로가 서로를 정신없이 찌르느라 멍들어서 그래!”
“그럼 하늘이 왜 푸른지는 알아?”
“사람들이 누군가를 때리기 위해 손을 들어 올릴 때마다 먼저 하늘을 아프게 찔러서 멍들어서 그래!”
“그럼 이건 어때? 개울물이 왜 푸른지는 알지?”
“…”
“그건, 내 눈물이야!”
**
자연수상록 -한 스푼- (ISBN: 978-89-6184-267-9)
고충녕 지음/ 어문학사/ 1만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