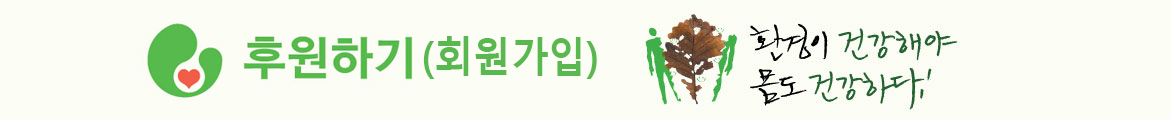무덤으로 피난갑니다
한겨레신문 2011년 7월29일자 기사입니다.
93살 할머니의 자살은 일본이라는 나라의 근대사에 대한 하나의 통절한 총괄이다. 올해 5월 후쿠시마현의 자살자 수는 예년보다 40%나 늘었다고 한다. 일본 사회의 황폐화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다. 나는 대학에서 2개의 세미나를 맡고 있다. 하나는 ‘예술을 통해 사회와 인간을 생각한다’, 또 하나는 ‘타자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다. 후자에서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증언자인 프리모 레비의 저작을 정독할 작정이었으나 지진 발생으로 예정을 바꿨다. 지진 관련 신문기사 등을 읽고 거기서 ‘타자의 소리’를 들어보기로 했다. 내가 신경쓴 것은 기사의 ‘디테일’(자세한 내용)을 읽고 상상력을 발동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우리는 보통 언론 보도를 통해 ‘정보’를 얻으려 한다.
한데 그렇게만 해서는 오히려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진 않을까. 희생자수가 2만 수천명이라는 정보를 들었다 해도 그것은 단순한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 정보를 얻은 데만 만족한다면 사건의 육체적인 감각을 잃고 공감력을 상실하게 된다. 공감(共感)이란, 서양에선 compassion(共苦)이라고 하듯 고통을 함께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타자의 고통에 지나치게 공감하면 자신의 존재가 위협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단계에서 공감의 스위치를 끄려고 한다. 그러나 그런 자발적 둔감성 때문에 어리석은 짓이나 참사가 되풀이된다면,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타자의 소리’를 들으려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7월9일 <마이니치신문>에 “무덤으로 피난갑니다”라는 제목의 큰 기사가 실렸다. 나는 즉시 이를 세미나 교재로 삼았다. 천천히 소리내어 읽는 것이다. 후쿠시마현에 사는 할머니가 6월 하순, 자택 마당에서 목을 맸다. 이 할머니는 미나미소마시에서 대대로 논밭을 일구며 살아왔다. 지진 발생 당시 장남(72)과 그의 아내(71), 손자 둘 해서 모두 5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다리에 힘이 없어 손수레를 의지 삼아 밀고 다녔는데, 집안일을 잘 처리하고 일기도 썼다. 후쿠시마 제1원전이 폭발한 뒤 이웃들은 하나 둘 피난을 갔고, 이 일가도 3월17일 원전에서 22㎞ 떨어진 자택을 떠나 북쪽의 이웃 소마시로 시집간 차녀의 집으로 피난했다. 그 다음날 시가 마련해준 버스로 더 먼 군마현으로 다시 피난을 갈 때, 장거리 이동이 무리여서 할머니만 차녀의 집에 남았다. 그 뒤 할머니는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뒤 5월3일 홀로 미나미소마의 자택으로 돌아갔다. 6월6일 군마에서 돌아온 장남 일가와 다시 함께 살게 됐으나 집이 ‘긴급시 피난준비구역’ 안에 있어서 원전사고가 악화되면 즉시 피난가야 할 처지였다. 장남 부부가 “또 피난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땐 함께 가요” 하고 얘기했으나 할머니는 별말이 없었다. 2주일 뒤인 6월22일 장남의 아내가 마당에서 목을 맨 할머니를 발견했다. 기사에는 가족한테 남긴 유서 전문이 실려 있었다.
“이번 3월11일 지진과 쓰나미만으로도 큰 난리였는데 원전사고까지 겹쳐 이웃 사람들에게 피난명령이 내려졌고, 3월18일 우리 가족도 군마 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나는 소마시의 딸이 사는 곳으로 3월17일 피난을 가게 됐습니다. 몸이 아파 입원한 뒤 건강을 회복했고, 2개월 정도 신세를 지다가 5월3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1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매일 텔레비전으로 원전 뉴스를 봤는데, 언제 좋아질지 알 수 없는 모양입니다. 또 피난을 가야 한다면 노인들은 거추장스러운 짐이 될 텐데, 우리 가족은 6월6일 돌아왔기 때문에 나도 안심했습니다. 매일 원전 얘기뿐이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 나는 무덤으로 피난갑니다. 미안합니다.”
읽고 나서 느낀 바를 얘기하라고 하자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유서 대부분이 히라가나로 씌어 있다.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사람 같다.” “‘거추장스럽다’는 얘기를 한 걸로 봐서 가족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다.” “원래 가문에 자살자가 생기면 수치스런 일이라는 의식이 있어서 가족과 친척들에게 용서를 빌려고 유서를 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자살한 할머니가 추상적인 정보나 기호가 아니라 살아 있던 인간으로 느끼게 된다. 학생 한 명이 중요한 지적을 했다. “유서를 보면 시종 ‘~게 되다’는 수동형으로 씌어 있는데, 마지막 문장만은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렇다. 그것이 이 기사의 중요한 디테일이다. 93년의 세월을 수동형으로 살아온 한 여인이 인생 최후에 결연히 자기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하지만 그 단 한번의 의사표명은 너무나도 무참한 것이었다. 이것은 분명 국가와 기업에 짓눌린 불합리한 죽음이다. 하지만 “자살과 원전사고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에 박힌 이유로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93살이라면 1918년께 태어난 셈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세계 제국주의 열강의 반열에 진입한 시대다. 그녀가 11살 소녀였을 무렵 세계 대공황이 일본에도 덮쳐왔고 도호쿠 지방 농촌은 대타격을 받아 여성 인신매매가 일상화됐다. 그녀는 아마도 같은 세대의 여자들이 팔려가는 걸 보며 자랐을 것이다. 일본은 공황 탈출 방도로 아시아 침략을 강화했고 결국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그리고 패전으로 이어졌다. 도호쿠 지방에서 황군병사로 출정한 남자들이 많은 사람(타자)들을 죽이고 자신들도 죽어갔다. 패전 뒤 도호쿠 지방은 다시 버려졌다. 고도 경제성장정책으로 1차산업은 파괴되고 젊은 노동력은 도시로 유출됐으며, 이 지방은 인구 과소지역이 됐다.
이런 곤경을 이용이라도 하듯, 도시에서 기피하는 원전을 국내 식민지라고나 해야 할 이 지방에 착착 지었다. 그 원전이 치명적인 대사고를 냈을 때, 전력을 향유해온 대기업과 도시 주민들이 아니라 도호쿠 지방 일반 민중이 불합리한 피해를 강요당했다. 93살 할머니의 자살은 일본이라는 나라의 근대사에 대한 하나의 통절한 총괄이다. 올해 5월 후쿠시마현의 자살자 수는 예년보다 40%나 늘었다고 한다. 일본 사회의 황폐화는 이제부터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다.
서경식/도쿄경제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