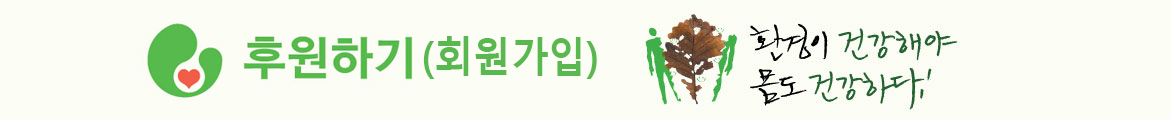고압선 지나는데... '전자파 기준치 이내'면 안전할까?
관리자
0
7542
2019.02.12 14:02
2019-02-11 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발암 유발 의심물질로 간주하는 전자파(극저주파 자기장)에 대한 인체보호 기준 마련 요구가 거세지만, 정부는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나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체에 유해한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정확한 기준 마련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자파’ 문제는 과학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사회적 기준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명성호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린포스트코리아>와 전화 통화에서 “‘과학적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마냥 기다릴 게 아니라 국내 실정에 맞는 ‘사회적 기준’을 먼저 마련해야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 휴대전화·전기장판·헤어드라이어 등의 일상화로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 빈도는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밀양, 부천 등 고압송전설비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전자파 유해성 문제에 따른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첨예하지만, 국내 노출 위험 기준은 WHO에서 권고한 833 밀리가우스(mG)가 고작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극저주파 자기장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밝히기 위해 1979년 이후 꾸준히 연구를 진행했지만, 아직 과학적 증거가 있는 위해성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극저주파 자기장이 유전자를 변형해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건강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증거가 제한적"이라 기준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정부의 설명은 사실이다. 고압선로가 지나는 인천 삼산지구 아파트 베란다에서 60mG의 전자파 발생해도 "법정 기준치 이내"라는 한국전력의 해명도 타당하다.
그렇다고 "법정 기준치 이내"가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전자파를 발암 가능 물질(2B)로 분류한다. 발암 가능성은 작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1990년대 초 발표된 덴마크 올슨(Olsen) 보고서에 따르면 송전선 인근 거주자들 중 1mG 이상에서는 림프종이 5배, 4mG 이상에서는 각종 암이 5.6배 증가했다.
또 스웨덴 연구기관 페이징(Feyching)은 1992년 보고서를 통해 송전선 인근 17세 이하 어린이 백혈병 발병률이 2mG 이상에서는 2.7배, 3mG 이상에서는 3.8배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스웨덴 정부가 주택단지 인근의 고압 송전선을 대대적으로 철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내 연구도 있다. 연세대학교 의대 환경공해 연구소는 1997년 일반인의 경우 하루 24시간 평균 30mG 넘지 않아야 한다며 송·배전선 등의 고압선로가 지나는 주변의 가옥 밀도가 해외보다 높으므로 지금보다 강화된 규제가 요구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명성호 연구위원은 “WHO가 권고한 기준도 급성 단기 노출 시 나타난 영향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일 뿐 낮은 세기의 전자파(2~4mG)에 장기 노출 시 인체 영향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잦은 전자파 노출에도 장기 노출에 대한 인체보호 기준은 사실상 없다는 뜻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초고압선로 인근에 운영되는 학교는 408개다.
명 위원에 따르면 국내보다 전자파 기준이 까다로운 유럽의 경우 네덜란드는 4mG, 스위스는 10mG를 기준으로 한다. WHO 권고 기준에 구애받지않고 각국 실정에 맞게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했다. 과학적 근거만 기준이 아니라 사회의 요구 역시 기준이 될 수 있는 사례다.
그는 "사회적 기준이 마련돼야 현재 고압송전설지 지중화사업으로 부천 상동 일대에서 빚어지는 갈등도 지금처럼 'OX 게임'으로 번지지 않고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성호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린포스트코리아>와 전화 통화에서 “‘과학적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마냥 기다릴 게 아니라 국내 실정에 맞는 ‘사회적 기준’을 먼저 마련해야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 휴대전화·전기장판·헤어드라이어 등의 일상화로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 빈도는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밀양, 부천 등 고압송전설비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전자파 유해성 문제에 따른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첨예하지만, 국내 노출 위험 기준은 WHO에서 권고한 833 밀리가우스(mG)가 고작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극저주파 자기장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밝히기 위해 1979년 이후 꾸준히 연구를 진행했지만, 아직 과학적 증거가 있는 위해성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극저주파 자기장이 유전자를 변형해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건강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증거가 제한적"이라 기준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정부의 설명은 사실이다. 고압선로가 지나는 인천 삼산지구 아파트 베란다에서 60mG의 전자파 발생해도 "법정 기준치 이내"라는 한국전력의 해명도 타당하다.
그렇다고 "법정 기준치 이내"가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전자파를 발암 가능 물질(2B)로 분류한다. 발암 가능성은 작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1990년대 초 발표된 덴마크 올슨(Olsen) 보고서에 따르면 송전선 인근 거주자들 중 1mG 이상에서는 림프종이 5배, 4mG 이상에서는 각종 암이 5.6배 증가했다.
또 스웨덴 연구기관 페이징(Feyching)은 1992년 보고서를 통해 송전선 인근 17세 이하 어린이 백혈병 발병률이 2mG 이상에서는 2.7배, 3mG 이상에서는 3.8배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스웨덴 정부가 주택단지 인근의 고압 송전선을 대대적으로 철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내 연구도 있다. 연세대학교 의대 환경공해 연구소는 1997년 일반인의 경우 하루 24시간 평균 30mG 넘지 않아야 한다며 송·배전선 등의 고압선로가 지나는 주변의 가옥 밀도가 해외보다 높으므로 지금보다 강화된 규제가 요구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명성호 연구위원은 “WHO가 권고한 기준도 급성 단기 노출 시 나타난 영향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일 뿐 낮은 세기의 전자파(2~4mG)에 장기 노출 시 인체 영향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잦은 전자파 노출에도 장기 노출에 대한 인체보호 기준은 사실상 없다는 뜻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초고압선로 인근에 운영되는 학교는 408개다.
명 위원에 따르면 국내보다 전자파 기준이 까다로운 유럽의 경우 네덜란드는 4mG, 스위스는 10mG를 기준으로 한다. WHO 권고 기준에 구애받지않고 각국 실정에 맞게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했다. 과학적 근거만 기준이 아니라 사회의 요구 역시 기준이 될 수 있는 사례다.
그는 "사회적 기준이 마련돼야 현재 고압송전설지 지중화사업으로 부천 상동 일대에서 빚어지는 갈등도 지금처럼 'OX 게임'으로 번지지 않고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