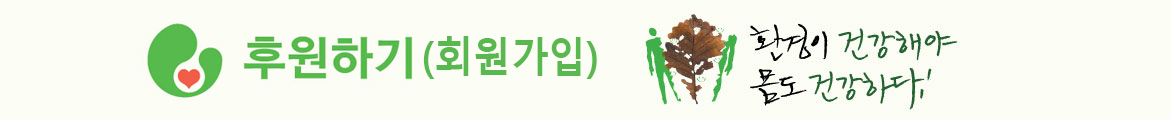[칼럼] 노아의 경고
동아일보 환경칼럼 정성희 논설위원
2014 4 8
대런 애러노프스키 감독의 영화 ‘노아’가 성경 왜곡 논란을 낳고 있다. 성경 창세기편에서 모티프를 따오긴 했으나 다른 스토리로 변주되고 있어서다. 논란의 핵심은 노아가 타락한 인간을 몰살하려는 창조주의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 방주에서 태어난 자신의 쌍둥이 손녀들까지 죽이려 든다는 점이다. 현대적 관점에서 영화 속 노아는 신의 대리인이라기보다는 생태근본주의자로 보인다.
인간만이 우월하고 고귀한 존재일까. 인간 없는 세상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애러노프스키 감독이 처음 해본 게 아니다. 미국 저널리스트 앨런 와이즈먼이 세계 곳곳을 다니며 취재한 사실에다 상상력을 더해 쓴 책 ‘인간 없는 세상’에 따르면 인간이 사라진 후 불과 몇 달이면 지구 생태계는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는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자연이 어떤 경이로움을 보여주는지를 한반도 비무장지대(DMZ)에서 풀어간다.
인간 없는 세상에선 대홍수처럼 가장 먼저 물의 공격이 시작된다. 빗물과 지하수가 인간이 만든 온갖 구조물에 스며들어 손상과 부식을 일으킨다. 1년이 지나면 고압전선에 전류가 차단되고 이렇게 되면 고압전선에 부딪혀 매년 10억 마리씩 희생되던 새들이 생명을 얻는다. 인간이 사라지면 가장 먼저 멸종하는 동물은 인간이 만든 따뜻한 환경에 서식한 바퀴벌레다. 20년 후면 고가도로를 지탱하던 강철 기둥이 부식돼 휘기 시작하고 파나마운하가 막혀 남북 아메리카가 합쳐진다. 댐은 무너지고 쏟아지는 물에 도시는 잠기게 된다.
애러노프스키나 와이즈먼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인간의 탐욕에 대한 경고다. 인간 없는 세상에서 10만 년이 흐르면 이산화탄소는 인류 이전의 수준으로 떨어지지만 사용 후 핵연료에서 나오는 방사능이 자연 수준으로 떨어지려면 100만 년은 더 흘러야 한다. 우리가 자원을 얼마나 파괴적으로 소모하고 있는지, 현대 과학기술 문명이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자원을 소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영화 속 두발카인의 “아버지와 아버지들이 해오던 삶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뿐인데 왜 우리를 버리려 드느냐”는 외침이 어느 정도는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이것도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얘기다. 생태계가 망가지면 인간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대홍수는 자연의 응징을 상징한다.
현재 생태계 파괴 속도를 보면 ‘노아의 방주’를 당장 만들어야 할 판이다. 산림훼손 도시화 남획 기후변화로 인해 1970년에서 2006년 사이 척추동물의 31%가 감소했고 바다 어류는 절반이 고갈됐다. 유엔은 생물 종 감소가 자연 상태보다 1000배 이상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2만934종의 동식물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멸종위기 목록에 올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생물의 10%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한다. 현대판 노아의 방주는 유전자원 은행쯤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생물 다양성은 열대 국가보다는 못하지만 북반구 온대 국가들에 비해선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숱한 동식물이 사라졌거나 사라지고 있다. 반구대 암각화의 고래와 민화(民畵) 속 호랑이는 멸종됐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반달가슴곰 복원 프로젝트나 돌고래 ‘제돌이’ 방사는 우리 국민도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과 가치를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전자원의 활용과 이익 공유를 규정한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비해 관련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 노아의 경고는 우리를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