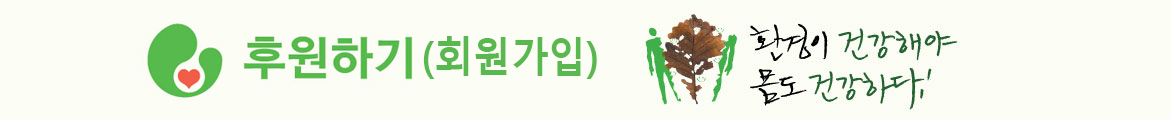스마트폰 전자파 대응책이 필요하다
한국산 스마트폰이 세계를 접수하고 있다. 올 1분기 북미시장 스마트폰 판매량은 애플 37.4%, 삼성 28.9%, LG 9.4% 등으로 한국산이 북미를 석권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이름만 보면 ‘똑똑한 전화’지만, 스마트폰은 라디오, TV, 전화에 컴퓨터까지 갖춘 귀여운 괴물로 변신해 있다. 그뿐인가. 아예 손바닥 안에서 은행 노릇도 하고, 신문이나 소설을 골라 읽는 도서관 역할까지 한다. 온갖 앱이 발달해가며 그 활용 범위는 한없이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걱정 역시 만만치 않다. 도박 수단으로 발달하는 것도 그렇고, 이를 이용한 범죄도 발달 중이니 그 또한 무섭다. 얼마 전 미국에서는 어느 여성이 휴대전화가 들어 있는 핸드백을 날치기당했다. 20분 뒤 전화를 빌려 남편에게 연락했다. 은행 비밀번호를 묻는 아내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남편은 이미 문자로 알려줬다는 것이 아닌가. 은행 계좌의 돈은 몽땅 사라진 후였다. 휴대전화에 누구나 금방 알 수 있게 남편의 번호를 넣어둔 것이 실수라면 실수였다.
진짜 걱정스러운 일은 건강상의 문제다. 스마트폰을 가능하게 해주는 전자파가 아무래도 찜찜하다. 전기가 있는 곳에는 전자파가 흐르기 마련이다. 전기 제품을 전원에 연결하면 전자기장이 생기고 거기서 나오는 파동이 전자파다. 세상을 밝혀주는 가시광선도 그 하나지만, 파장이 보다 긴 것과 보다 짧은 것들이 스펙트럼을 만든다. 그 가운데 자외선은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 가정의 전자레인지도, 병원의 X선도 다 전자파다. 온갖 전기기구도 마찬가지다. 전자레인지는 순식간에 음식물을 덥혀주지만, 까딱하면 음식물을 새까맣게 태워버린다. 병원 X레이실의 두꺼운 차단벽이 우리를 섬뜩하게도 한다.
주파수가 서로 다르다고 하지만 바로 그 전자파가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에 사용되니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위험성에 대한 해석은 천차만별이고, 연구 성과 또한 한우충동(汗牛充棟)으로 많다. 최근 미국에서 임신 중에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 아이가 소아비만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소아비만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이니, 이 연구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그 연구가 잘못됐다는 주장이 곧 뒤따랐다. 미국 과학원이 그 관련성을 증명할 수 없다는 포괄적이고도 철저한 보고서를 낸 일이 있다며 이를 부정한 것이다.
정말 그럴까. 전 세계의 휴대전화 사용자는 수십억명에 달한다. 그 위험성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는데, 갈피를 잡기가 어렵다. 2006년 덴마크 학자들이 42만명을 대상으로 20년간 벌인 연구라며 전자파가 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증거가 없다고 하자, 독일 연구진은 곧 그 결과에 의문을 던졌다. 2007년 스웨덴에서는 10년 동안 하루 한 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암에 걸릴 위험을 높인다고 했고, 뇌종양은 휴대전화를 좌우 어느 쪽에 대느냐에 따라 그쪽에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호주 학자들은 어린이들에게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작년 3월 영국에서는 그동안의 휴대전화 보급 규모에 상응하는 암 발생률 증가는 없었다는 결론을 낸 일도 있다. 초기에는 전자파의 발암성에 대해 “확실한 증거가 없다”던 세계보건기구(WHO)는 2011년 5월에는 아주 약하게 그 관련성을 인정하는 태도로 변하기도 했다. 갈피를 잡을 수 없다.
그런 가운데 프랑스에서는 휴대전화 기지국을 철거하라는 법원 명령이 내려진 일도 있고, 이탈리아에서는 12년 동안 하루 6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람의 암 발생을 직업병으로 인정해 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일도 있다. 전자파 피해 문제가 법정에까지 등장하기 시작한 모양이다. WHO가 이에 대한 예비경고를 발표한 일이 있다. 가능한 한 전화 사용시간을 줄이고, 어린이의 사용을 제한하며, 얼굴에서 전화를 멀리하거나 이어폰을 연결해 쓰라고도 한다. 참고할 일이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하는 한국의 제조사들은 이런 문제에 대처할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박성래 한국외대 명예교수·과학사
한국경제신문 2013년 5월9일자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