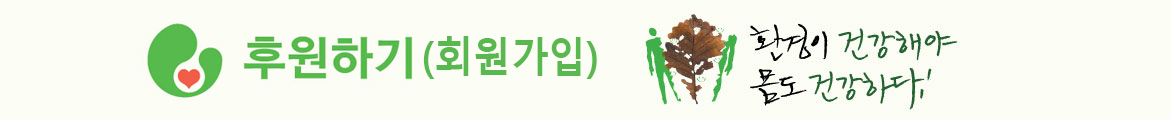이계삼 칼럼; 머리카락

두어달 전, 회의하러 갔다가 서울역에서 우연히 전교조 시절 친구를 만났다.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밀양송전탑 일로 돌아다니고, 친구는 전교조 본부 전임자가 되어 전국을 돌아다니다 우연히 서울역에서 마주친 것이었다. 친구는 모자를 쓰고 있었고, 나는 직감적으로 그가 세월호 유족들의 삭발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뜻으로 머리를 깎은 것이라 생각했다.
내 짐작은 틀리지 않았다. 세월호 유족들이 선체 인양과 ‘쓰레기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며 삭발 기자회견을 하던 자리에 다녀온 뒤부터 괴로운 마음을 견딜 수 없어서 혼자 동조 삭발한 것이라 했다. 1997년이었던가, 북한의 기아사태가 번져갈 무렵, 북한 아이들을 생각하며 한달 넘게 점심을 굶고 그 돈을 모아 북한 돕기에 후원하던 어느 친구처럼, 외면하고만 싶었던 세월호로 나를 이끌어준 친구의 삭발이 고마웠다.
그리고 어느 간담회 자리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직접 보게 되었다. 열 분 중에 여섯 분이 머리를 깎은 상태였다. 그저 ‘평범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얼굴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카트를 부딪치거나, 1월1일 해돋이공원에서 인파에 떠밀리다 신발 뒤축을 밟고서는 서로 미안하다며 인사하다 마주칠 것 같은, 선량한 얼굴이었다. 그들은 이야기하고 들으며 조용히 자주 울었고, 눈물짓는 얼굴들을 서로 담담히 지켜봐주었다. 한숨은 낮았고, 눈물은 고요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몇 사람의 휴대전화 알람이 각자 다른 벨소리를 내며 동시에 울렸다. 오후 4시16분이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 마음은 어떤 것일까. 24시간 내내 한시도 잊히지 않는, 혼자 있을 때는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생각이 결국 ‘그날 그 시간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서둘러 빠져나와야만 ‘살 수 있는’, 빠져나오지 않으면 숨막혀 죽을 것만 같은 그 순간들을 하루에도 몇번씩 반복해야 하는 이들은 또 어떤 마음에서 약속이나 한 듯 오후 4시16분에 알람을 맞춰 놓으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일까. 그들을 만나고 온 뒤 나는 며칠 동안 가벼운 우울증 비슷한 것을 앓았다. 삭발한 그들의 말간 얼굴이 떠올라 슬퍼졌고, 다 부질없는 것 아니냐는 허무가 괴롭혔다. 며칠 만에 겨우 일어섰다. 그들과 나의 안타까운 거리를 인정하자고 생각했다. 부질없는 우울로 분노를 휘발시키지 말자, 내 자리에서 내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싸우자, 그리고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리고 이제 나도 머리를 깎았다. 언젠가 이 지면에서도 소개한 적 있는, 내 밀양송전탑 싸움의 동료이자 친구인 김정회에게 법원의 디엔에이(DNA) 채취 영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나는 흉악범죄자의 디엔에이를 채취하는 것에도 결단코 반대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시대 젊은이의 사표가 되어 마땅한 존경스러운 농민 김정회에게 디엔에이 채취 영장이라니. 검찰 집행관은 규정도 어긴 채 전화로 통지하고는 집으로 찾아와서 들이댔다. 김정회가 ‘영장 받아 오라’며 거부하자, 기분이 상한 그는 ‘집 앞 공터가 불법 형질변경’이라며 엉뚱한 트집을 잡았다. ‘상관없는 일로 왜 협박이냐’며 김정회가 땅 소유자를 확인해주지 않자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집행관은 ‘영장 받아 오면 수갑 차고 가게 될 거다’라는 폭언으로 협박했다.
녹음된 통화 내용을 들으면서 나는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 그리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다음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주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김정회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집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이제 나도 머리카락을 잘라야겠다고 다짐했다. 지금 이 나라, 공화국은 ‘집단모멸체제’이다. 이 나라에서 사는 것이 그저 욕되다. 안타깝고, 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