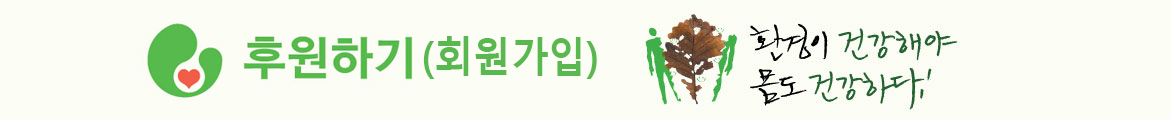가습기, 논문만 쓰고 앉아 있었던 질병본부

[한삼희의 환경칼럼] 가습기, 논문만 쓰고 앉아 있었던 질병본부
2016년 5월 1일자 조선일보
의사나 보건의료 전문가라면 1854년 영국 런던에서 만연한 콜레라를 종식시킨 의사 존 스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병원균이라는 개념도 없던 때다. 공기 오염이 콜레라를 퍼뜨린다고 보는 견해가 많았다. 스노는 환자들 분포와 생활 습관을 조사한 후 오염 우물이 원인인 걸 밝혀냈다. 우물을 폐쇄하자 콜레라는 사라졌다.
방역 시스템으로 좀 더 일찍 가습기 살균제 괴질의 정체를 규명해 피해 확산을 막을 순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가습기 자료들을 뒤지다가 뜻밖의 논문과 마주치게 됐다. 2009년 3월 대한소아과학회지에 실린 '급성 간질성 폐렴의 전국적 현황 조사'이다. 2006년 초부터 원인 미상의 어린이 간질성 폐렴에 주목했던 서울아산병원 소아과 홍수종 교수 등 15명이 저자로 돼 있다. 2008년 초까지 3년째 괴질이 유행하자 그해 8월 전국 23개 종합병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여 비슷한 어린이·유아 증례(症例)를 수집해 78명의 환자를 확인했다. 그중 36명이 사망한 상태였다. 별도로 2008년 2~8월 발병한 서울 5개 병원의 어린이 괴질 환자 9명의 치료 경과도 조사했다. 그중 7명이 사망했다.
그런데 문제의 논문 저자 명단에 당시 질병관리본부 바이러스팀장과 해당 팀 연구원 이름이 올라 있었다. 두 명은 환자 폐 조직·분비물 등을 분석해 원인물질을 찾는 역할을 맡았던 듯하다. 홍 교수를 비롯한 서울 주요 대학병원 소아과 책임자들은 그해 봄 질병관리본부 담당 팀장 등과 모임을 갖고 괴질의 확산 양태 조사와 원인 규명에 나서기로 했던 것이다. 논문은 '모종의 바이러스가 원인일 수 있으나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전국 병원 조사가 있은 지 3년 뒤인 2011년 8월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가 괴질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 고윤석 교수가 그해 4월 급성 폐렴 임산부 환자의 집단 발생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에 정밀조사를 촉구해 5월부터 시작된 역학조사 결과였다. 질병관리본부 중앙역학조사반은 환자들 집을 방문해 병력(病歷)과 가족력, 생활환경·습관, 살균제·방향제·농약 등 노출력 등을 상세히 조사했다. 질병관리본부 발표 후 더 이상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 살균제 백서(2014년 12월)는 2006~11년의 연도별 성인 환자 수를 집계해놨다. 2006~08년의 3년 동안 9명(12%) 확인된 반면, 2009 ~2011년의 3년은 66명(88%)이나 됐다. 만일 2008년 소아과학회와 질병관리본부의 전국 현황조사 직후 정밀 역학조사가 이뤄졌다면, 2009년 이후의 급속 확산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환자가 늦겨울~이른 봄에 주로 나타나고, 영·유아에 치중돼 있고, 피해가 전국에 두루 분산돼 있으며, 가족 집단 발병이 많은 데다, 별다른 섭취 음식과 병력 특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만 갖고도 괴질의 성격을 어느 정도는 좁혀갈 수 있었을 것 같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160년 전 영국 의사 수준도 못 됐다. 무엇보다 '78명 발병, 36명 사망' 사태를 놓고도 어떻게 그냥 넘어갔던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윗선에 보고가 안 됐던 것인지도 궁금하다.
실무자 실책도 있었겠지만, 개인 탓을 따지기 앞서 조직의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작년 메르스 사태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안일과 태만을 겪어봤다. 질병관리본부는 군대(軍隊) 비슷한 조직이 돼야 한다. 평소엔 별로 할 일이 없다. 그러나 메르스나 가습기 살균제 같은 사태가 터지면 국민 생명·안전이 그들의 능력과 노력에 달려 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꾸준한 훈련과 대비로 언제든 즉각 전 조직을 동원할 수 있는 긴장을 유지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다시 드러난 질병관리본부의 모습은 그런 기대와는 거리가 너무 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