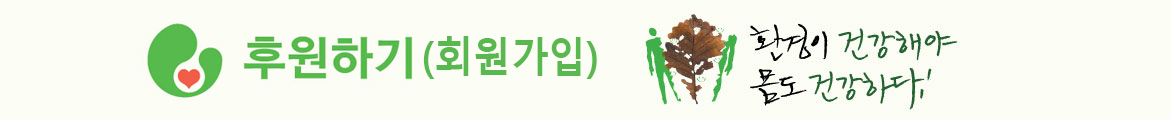[박원순과 최열]

|
[강명구 칼럼] 박원순과 최열 |
한국 시민운동을 대표했던 두 사람. 이들의 운명이 크게 갈라져 있다. 박원순은 서울 시정을 이끌고 있고, 최열은 알선수재라는 ‘파렴치한’ 범죄 혐의로 감옥에 갇혔다. 1987년 민주화 이래 대표적 시민운동가 두 사람의 현재가 어떻게 이렇게 대비될 수 있는가 싶다.
박원순 시장은 참여연대,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등 한국 시민운동의 빛나는 길을 연 사람이다. 반부패 운동부터 총선 연대까지, 기부가 사람을 바꾸는 힘을 믿게 한 아름다운재단, 그리고 소셜디자이너를 자처하며 만든 희망제작소까지. 그러던 그가 이명박 정권에 의해 탄압을 받으면서 떠밀리듯 제도정치권으로 나아갔다. 그는 예상했던 대로 하루를 48시간처럼 살면서 서울시민의 삶의 현장을 누비고 있다. 서울역사에 온돌을 깔아 노숙자들에게 누울 쉼터를 만들어준 건 내게 큰 감동이었다. 사람살이를 위한 정치.
최열이 한국공해문제연구소, 공해추방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등 한국 환경운동의 산 역사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동강댐, 새만금, 반핵과 탈원전 그리고 4대강까지. “공해 추방? 배불리라도 먹었으면” 하던 시절부터 4대강까지, 환경은 성장과 발전을 반대만 한다는 비난을 거스르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해 작지만 단단한 초석들을 쌓아왔다. 그러던 그가 환경운동을 시작한 지 31년 만에 다시 감옥에 갇혔다.
시민운동을 이끌어왔던 두 사람의 대비되는 현실을 앞에 두고 한국 시민운동의 현재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시민운동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기반이다. 참여연대가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는 부패와 부정, 재벌과 관료, 공공부문의 부당이득 감시운동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했는가. 한국 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수준은 국민소득 2만달러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에 나아가 있다. 그런데 시민운동이 이명박 정권 아래서 위기에 빠졌다.
이명박 정권 아래 관변 시민운동은 약진하고,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시민운동은 위축되었다. 무엇보다 시민운동가들이 도무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50대 전후 사무총장이나 대표가 임기를 마치면 갈 곳이 없다. 20년 된 활동가가 200만원 남짓, 대다수 전업 활동가들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생활을 한다. 이래서는 건강한 시민운동을 기대할 수 없다. 유럽의 경우 시민운동을 전업으로 하는 활동가들이 공무원의 80% 정도 되는 보수를 받는다.
촛불시위 이후 이명박 정권은 시민운동단체로 유입되는 돈줄을 끊거나 삭감했다. 행정안전부가 주는 시민단체 보조금 중 보수단체 지원금이 2009년 4억7000만원에서 2012년 37억7000만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1800여개 단체는 불법 폭력시위 단체로 규정되어 3년간 이 기금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시사저널> 2012년 6월) 그리고 이들을 대표하는 박원순·최열의 개인비리를 캐고자 특별검사팀까지 꾸렸다. 1년 이상을 털어도 먼지조차 나오지 않았지만, 박원순은 결국 제도정치로 나아갔다. 최열은 알선수재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재단 공금 횡령은 모두 무죄, 개발업체의 로비 대가로 알선수재 유죄. 그런데 최열을 수사했던 김광준 검사가 10억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 더구나 김 검사에게 뇌물을 준 업체는 최열에게 돈을 주었다는 개발업체와 경쟁관계에 있음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알선수재는 1심에서 무죄가 난 사안이었는데, 2심에서 심의도 없이 유죄로 뒤집혔다.(이 부분에 대해 제발 어떤 언론사나 기자가 탐사보도를 해서 진실을 밝혀줬으면 좋겠다.)
시민운동의 위기는 운동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데서 시작되었다. 건강한 시민운동이 투명하고 행복한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을 안다면, 전국 수백명에 달하는 시민운동 활동가들에게 100만원 남짓 되는 월급만 받으며 헌신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더욱이 시민운동은 태생적으로 기득권, 성장과 개발에 반하는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건강한 시민사회는 이들에게 신뢰를 보내고, 최소한의 생활기반을 마련해줄 책무가 있는 것 아닐까. 그래야 제도정치로 나아가지 않고 시민운동에 전력투구하는 활동가들이 많아지리라 믿는다.
강명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2013년 3월 18일자 한겨레신문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