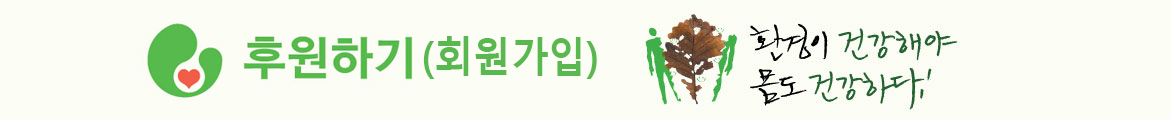서울시청역 천장에 붙어 있는 놈, 불멸의 물질, 죽음의 먼지
<중앙일보 이규연 논설위원>
불멸의 물질, 죽음의 먼지
중앙일보 2013 10 25
하루 5 만 명이 오가는 지하철 2호선 서울시청역. 전동차에서 내려 철제 천장을 올려다본다. 천장 너머 냉방설비가 자리 잡은 밀폐공간, 그 보이지 않는 공간의 벽면에 작지만 아주 위험한 놈들이 닌자처럼 몸을 숨기고 있다. 현미경으로 보면 비늘 모양을 한 놈, 공기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면 폐포에 꽉 달라붙어 암을 유발하는 놈, 바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다. 놈들은 밀폐공간의 벽면에 분말 형태로 들러붙어 있다.
최근 국감에서 서울지하철 1~4호선 곳곳에 석면 자재가 남아 있다는 자료가 공개됐다(김경협·박덕흠 의원). 특히 시청을 포함해 을지로입구·삼성 등 2호선 7개 역에는 입자 형태로 살포돼 있어 그 유해 잠재력이 크다는 것이다. 관리 주체인 서울메트로에 질의해 봤다. 석면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음은 인정했다. 하지만 놈들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철벽 수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역사별 3년치 측정자료도 보내왔다.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기록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 중 하나가 천장 너머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살벌한 팩트임에 틀림없다.
석면은 두 얼굴을 지닌 광물이다. 희랍어로는 ‘소멸시킬 수 없는(asbestos)’이란 뜻을 갖는다. 잘 갈라지고 타지 않으며 마모에 강해 불멸의 물질이라는 명예를 얻었다. 단열재·흡음재·브레이크·지붕재 등 생활 곳곳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놈들의 흉측한 이면이 본격적으로 폭로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들어서다. 이때부터 죽음의 먼지, 조용한 암살자, 침묵의 시한폭탄이라는 악명을 얻게 된다.
이후 우리는 고비마다 다음 세대를 배려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 첫째 고비는 1970년대 중반이었다. 당시 미국·서유럽은 석면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 시작한다. 반면에 우리는 소비에 팔을 걷어붙인다. 100만 호 이상의 초가 지붕을 석면 슬레이트로 바꾼다. 자체 생산으로도 부족해 수입까지 한다. 당시는 일그러진 모습을 볼 능력이 없었다고 핑계를 댈 수 있다. 1980년대 들어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도 석면이 죽음의 시한폭탄임이 밝혀진다. 그런데도 국내 사용량은 오히려 늘어난다. 실제로 1985~89년 매년 20%씩 증가했다. 미국에서는 석면이 쓰인 학교 건물을 통째로 뜯어내는 판에 우리는 몇몇 품목을 제한하는 데 그쳤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일본 등이 고강도의 척결 작전을 진행 중일 때 우리는 지나치게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서울시청역 등에서 냉방공사가 벌어진 시점은 10년 전이었다. 석면의 본색이 명명백백 드러난 때였다. 공사할 때 놈들을 제거했어야 옳았다. 뒤늦게 없애려니 수백억원을 들여 설비를 다 걷어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공항·철도·가옥에서 놈들을 계획대로 척결하지 못하는 사정도 비슷하다. 예산 부족이 큰 걸림돌일까. 그보다 더 뿌리 깊은 이유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않으려 하는 까막눈적 미래관이리라.
폐 속에 들어간 놈들은 대개 2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인체를 유린한다. 15년 뒤쯤 놈들의 폐해는 극에 달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 또다시 머뭇거리며 시한폭탄을 미래세대에 넘겨야 할까. 오늘도 서울시청 2호선에서 내린다. 그리고 대합실 천장을 올려다본다. 서울메트로가 놈들을 잘 가둬놓기를 기원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