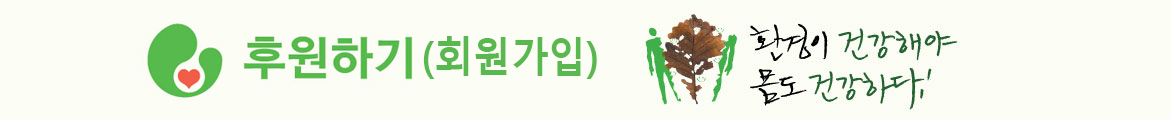유럽연합, 소 잃고 외양간 고쳤다

세계일보 2013 10 18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유기용제 폭발사고 등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뒤 당국이 규제나 검증체제를 보완할 때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을 얘기한다. 하지만 소를 잃은 후에 외양간을 얼마나 제대로 고치느냐에 따라 같은 사고가 재발하느냐, 아니면 미래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
오늘날 화학물질 관리 선진국 역시 과거 비극적인 사고를 겪었다. 영국은 1974년 플릭스보로에 있는 화학공장 폭발사고로 28명이 사망하고 89명이 부상했다. 이로 인해 ‘보건안전법’이 제정됐다. 1976년 이탈리아 세베소 지역의 화학공장에서 염소가스와 다이옥신이 대량으로 누출됐다. 당시 오염된 토양은 1800ha에 이르렀고, 직접적인 재산 피해는 2억5000만달러로 추산됐다. 이 사고는 유럽 전체에 산업사고 예방지침인 ‘세베소 지침’이 도입되는 전환점이 됐다.
이후 인도(1984년), 멕시코(1986년), 스위스(1986년), 미국(1989년) 등에서도 중대형 화학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국제적으로 화학물질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 결과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가 글로벌어젠다 21에 포함됐다.
 |
| 이호성 KIST유럽연구소장 |
유럽연합(EU)은 2007년 6월 ‘신화학물질관리법(REACH)’을 시행했다. EU 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지만 화학물질 수입업자에게도 의무가 부여됐다. 그 결과, REACH는 한국은 물론 EU에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규제가 됐다. 한국도 지난 5월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2015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REACH나 화평법처럼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현재’보다는 ‘미래’를 내다봐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EU의 사례를 볼 때 규제가 반드시 산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유럽통계청이 2012년 발간한 ‘REACH 제도 5년 평가’ 보고서와 유럽공동연구센터(JRC) 통계자료에 따르면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은 대폭 줄어들었다.
반면 REACH 도입 이후에도 EU의 화학물질 수출입 규모는 증가했다. 다시 말하면, 산업은 커졌는데 사고는 줄어든 것이다. REACH 제도는 지금까지 단일화학물질 중심으로 등록이 진행돼 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혼합물 및 완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규제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기업은 경제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사전예방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사후처리에 드는 총 경비를 비교한다면 장기적으로 예방이 더 유리한 것은 확실하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글로벌 주요 이슈가 된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이를 피할 수 없다. 환경과 안전을 잘 보전하고 관리하면서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