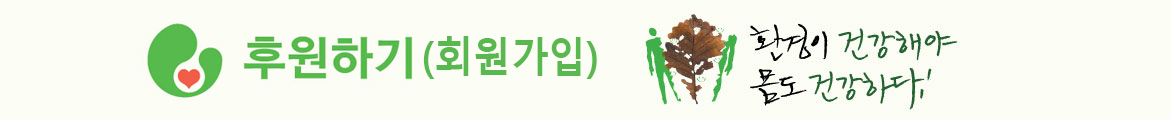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
교수신문, 2016년6월8일자
우리 사회에서 교수들의 영향력은 엄청나다. 전문가 자격으로 복잡한 사회 문제에 대한 진단과 치유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정책의 수립·수행에도 참여한다. 교수의 전문성과 독창성은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다. 교수들의 사회 참여에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면 얄팍한 이익을 챙기거나 어설픈 권력을 즐기는 교수들도 많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경우가 그렇다. 산업부가 살인 제품을 ‘세정제’로 허가해주고, 일부 제품에 KC 마크를 붙여주는 과정에 적지 않은 수의 교수가 심의·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그런데 자신들이 세정제로 허가해준 제품에 정작 세정·세척 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한 전문가는 한 사람도 없었다. 최소한의 독성자료도 챙겨보지 않았고,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살인적인 사용법도 걸러내지 못했다. 당시 산업부 결정에 참여했던 교수들만 정신을 차렸더라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피할 수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 사실을 처음 확인했던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판단에도 많은 교수가 참여했다. 질병관리본부가 교수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PHMG(옥시싹싹)와 PGH(세퓨)가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은 다행이었다. 그런데 어설픈 동물실험만을 근거로 폐 손상의 범위가 폐섬유화에만 한정된다고 한 판단은 명백한 졸속이었다. 자동차에 치이면 온몸에 문제가 생기는 법이다.
CMIT/MIT(가습기메이트)가 폐 손상의 원인물질이 아니라는 판단도 피해자의 존재 자체를 철저하게 무시한 엉터리 결론이었다. 특히 일부 제품에 면죄부를 줘버린 것은 단순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 안전성평가연구소도 당시 동물실험이 충분히 정교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잘못된 판단에 대한 책임도 무겁다. 1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지금까지도 피해사실을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3·4등급으로 분류돼버린 가습기메이트 사용자들이 그렇다. 과연 질병관리본부의 당시 판단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의 민간위원회가 뒤늦게 피해 증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어설프게 면죄부를 받았던 제품의 위해성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도 다행이다. 그런데 피해 증상의 범위와 제품의 위해성을 동물실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은 완전히 상식을 벗어난 황당한 것이다. 동물실험은 이미 발생한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과학적 방법이 아니다.
동물실험은 인간에게 발생한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는 과학적 진단 수단이 될 수 없다. 사람은 흰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방법으로는 흑사병과 유행성출혈열의 원인도 밝혀낼 수 없다. 피해의 원인은 피해자에 대한 정밀 의료기록을 통해 파악해야만 한다.
생활화학용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환경부의 발표도 당혹스러운 것이다. 살생물질의 구체적인 독성을 파악하기 위해 가능성은 인터넷에 널려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널리 알려진 자료를 동물실험을 통해 재확인하겠다는 정책은 무의미하고 낭비다. 자칫하면 독성학자들이 연구비 확보를 위해 억지를 쓴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미 확인된 살생물질의 위해성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안전한 사용법’이다.
낯선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심층연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우리들의 이기적인 모습은 절망적이다. 연구를 핑계로 내세우는 집단이기주의가 보건·의료 분야에만 한정된 것도 아니다. 경제·경영·정책·사회학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만연된 고질적 병폐다. 교수를 들러리로 세우는 관료들의 못된 행태도 개선해야 한다.
이덕환 논설위원/서강대·화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