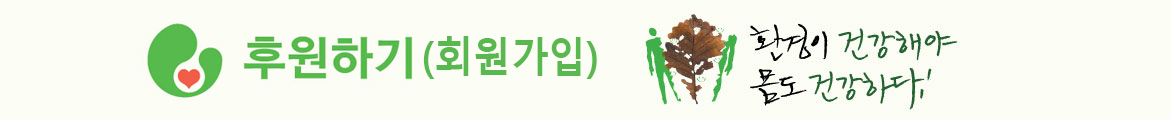가습기 살균제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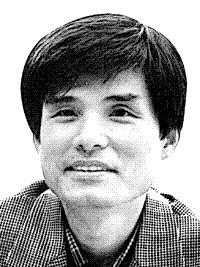
가습기 살균제 사고
경향신문 2016년 5월15일 이필렬 칼럼 [녹색세상]
20년 전 첫 아이가 생겼을 때 가습기를 처음 샀다. 아기와 산모에게 좋으니 반드시 틀어야 한다는 아내의 고집스러운 주장에 허리를 굽혀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용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벽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더니, 보름 새에 벽 위쪽이 검푸른 곰팡이로 가득 찼다. 그제서야 가습기를 치웠고, 그 후로 지금까지 가습기를 사용한 적이 없다.
가습기가 없는 우리 집은 수십년 된 낡은 집이다. 여기저기 틈새가 많다. 겨울철에는 차가운 공기가 틈새를 통해 실내로 꽤 많이 들어온다. 집안 공기가 건조해질 수밖에 없다. 상대습도를 측정하면 아주 낮게 나온다. 30%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정부나 가습기 회사들의 권장치 60%의 절반도 안된다. 그래도 그 때문에 우리 식구가 감기에 걸리는 일은 없다. 어느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믿지 않는다. 어려서부터 겨울철만 되면 건조한 공기가 감기를 유발한다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와 “건조한 공기는 감기”라는 등식이 몸과 머리에 꽉 박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얼마나 건조해야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생각조차 해보지 않는다. 겨울철에는 습도가 높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가습기에서 생기는 세균은 걱정해도 가습하는 일 자체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실내습도를 60%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하지만, 연구결과를 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적정 실내습도, 정확하게 말하면 쾌적하다고 느낄 수 있는 습도는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범위도 아주 넓다. 유럽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지만 20도에서 쾌적함을 느끼는 상대습도는 20%에서 80%에 걸쳐 있다. 24도에서는 이 범위가 아래로 내려가서 18%에서 65%가 된다. 우리나라 아파트의 겨울철 실내온도가 24도 수준이니, 이 연구를 믿는다면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은 건조한 공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사람 사는 아파트의 습도가 20% 아래로 내려가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유난히 아파트 거주자들이 습도에 예민해서 가습기를 많이 사용한다.
가습기 보급은 세균 걱정을 불러왔다. 언론은 이를 부풀려 보도했고, 업체들은 가습기 살균제 판매에 이용했다. 이들 살균제는 대부분 염소를 포함한 유기물이다. 염소가 들어간 청소용 살균제로 널리 쓰이는 것이 락스다. 락스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가스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염소나 염소를 함유한 유기물이 발생해서 공기 중에 퍼진 다음 기도와 폐로 들어가서 세포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염소가 포함된 유기물은 대부분 몸에 좋지 않다. 특히 흡입했을 때 더 나쁘다. 그래서 상당수 유기염소는 살충제로 사용된다. 지금은 사용금지된 DDT도 염소 함유 유기물이다. 가습기 살균제도 염소가 들어 있으니 흡입할 때 적지만 자극이 있을 것이다. 아주 예민한 사람이라면 자극을 감지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자극을 느끼지 못한 채 오랫동안 살균제를 흡입했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장기간의 세월호 사고, 단기간의 방사능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장기에 걸친 사고의 피해 규모는 파악이 쉽지 않다. 피해가 발생한 시간과 공간이 아주 넓기 때문이다.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수천명에서 수십만명까지 다른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니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축소할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도 피해 파악이 어렵다. 정부에서는 사망자를 포함한 피해자의 수가 530명 정도라고 하지만, 훨씬 더 많을 것이다. 530명은 정부에서 확인해 피해로 판정한 수일 뿐이다. 정부는 피해를 축소하고 싶어할 것이다. 책임도 축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찌됐든 세월호 사고와 마찬가지로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해서도 정부는 책임이 있다. 그 큰 사고가 오랫동안 진행되도록 방치한 점에서 책임은 훨씬 더 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