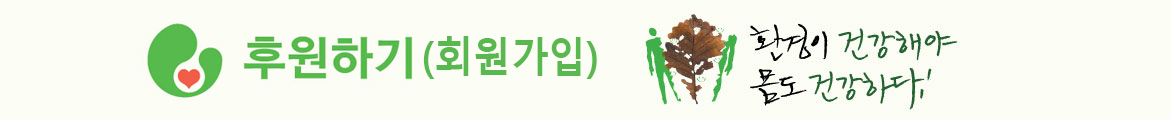[영남일보] “불에 타고, 먼지로 남다”… 산불이 남긴 또 하나의 재앙 ‘석면 공포’
“불에 타고, 먼지로 남다”… 산불이 남긴 또 하나의 재앙 ‘석면 공포’
- 인쇄
- 글자작게
- 글자크게
재난 이후에 더 위험한 '침묵의 살인자'
“이재민과 복구인력, 또다시 위협받는다"

경북 안동의 한 산불피해마을의 모습과 석면오염 우려지점을 노란점선으로 표시했다. 안동환경운동연합·대구환경운동연합 제공
경북 안동을 비롯한 동해안 일대를 삼킨 2025년 봄의 초대형 산불. 불은 꺼졌지만, 재 속에 남은 '1급 발암물질 석면'이 이제는 주민의 숨을 위협하고 있다. 슬레이트 지붕이 타며 드러난 석면 조각들이 또 다른 재앙의 불씨가 되고 있다.
지난 3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가 발표한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산불로 파괴된 주택과 창고 대부분은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을 갖고 있었고, 이들이 불에 타며 공기 중에 대량의 석면 가루가 흩날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석면은 폐암이나 악성중피종 등 심각한 질환을 일으키며, 최대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이후 환경성 석면질환으로 인한 피해자는 8천254명에 달하며, 그 중 35%는 이미 목숨을 잃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추가 피해가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위험이 산불 이후 복구 과정에서 더욱 증폭된다는 점이다. 슬레이트는 불에 타면서도 부서지기 쉬워,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미세한 석면 가루를 뿜어낸다. 이로 인해 철거 작업자나 복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이재민들까지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보고서에서도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은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파편은 밀봉해 석면전용매립지로 옮겨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석면에 대한 경각심은 여전히 낮고, 제대로 된 보호 장비 없이 복구작업에 나서는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농촌이나 산간 마을에서는 슬레이트 지붕이 여전히 흔하며, 이런 구조물은 제대로 된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정부가 파악한 2021년 기준 전국 슬레이트 건축물은 약 95만 채지만, 보고서에선 “작은 창고나 덧댄 지붕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론 100만 채를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는 과거에도 반복돼 왔다. 2017년 포항 지진,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도 석면 노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그럼에도 국내에서 석면은 여전히 많은 건축물에 남아 있고,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예고 없는 살인자'로 재등장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와 지자체, 산림청, 소방청이 협력해 석면 문제를 산불 복구의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단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아직 남아 있는 슬레이트 지붕도 비석면 소재로 교체하는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재해는 한순간이지만, 그 여파는 수십년에 걸쳐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