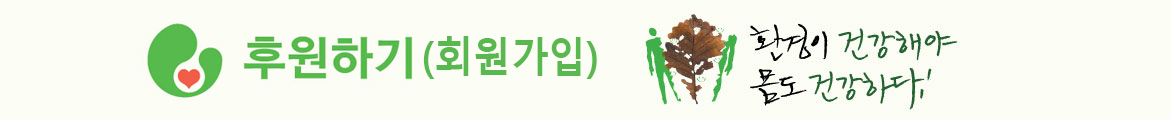[뉴스1] "유명무실한 환경영향평가"…전문가 87% '사후관리 강화'
관리자
0
5043
2024.07.14 21:03
서울연구원, 실무 관계자 91명 대상 설문
평가 통과한 소각장 유해물질 배출 등 허점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 회원들이 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 출범 기자회견에서 환경영향평가 국가공탁제 도입과 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허위'로 통과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관련 실무 전문가들이 상시 모니터링 등 '사후 평가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산하 서울연구원은 최근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항목·심의기준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대행사, 심의위원, 공무원 등 환경영향평가 실무자 대상으로 진행한 제도 개선 포럼·설문조사의 내용을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 도입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91명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6.8%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53.8%가 사후관리 강화 여부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는 강한 긍정 의사를 내비쳤다.
사후관리 방안으로는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 체계 강화'(1순위 31.9%, 1·2·3순위 78.0%), '사후관리 매뉴얼·체계 마련'(1순위 27.5%, 1·2·3순위 74.7%), '사후관리 불이행 시 규제 등 법제화 강화'(1순위 20.9%, 1·2·3순위 65.9%) 등이 제시됐다.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허위'로 이뤄진 뒤 사후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환경영향평가는 취지가 좋은 정책이지만 특정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할 때의 조건들이 사후에도 잘 지켜지는지 살피지 않는 탓에 제도 자체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봐도 좋다"며 "이 같은 문제 의식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건강환경영향평가 등 보완적 조치들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사업이 본 평가를 통과하기만 하면 그 이후에는 만사형통"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적으로 생긴 쓰레기 소각 시설이 사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예다.
쓰레기 소각장은 용량이 100톤을 초과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환경부의 2020년 조사에서 소각장, 제철 생산시설 가운데 13%가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다이옥신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톤 이상인 소각장도 상당수 포함됐다. 특히 전남의 한 소각장은 배출 허용 기준치를 90배나 초과하는 다이옥신을 배출하다 적발됐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용량이 100톤 이하인 경우 환경영향평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이 문제로 작용한 사례도 있다.
충북 청주시 북이면은 1999년 첫 소각장을 시작으로 2010년 세 번째 소각장이 가동되며 현재 인구가 4800여 명에 불과한 지역에서 전국 쓰레기 소각량(일 7970톤)의 6.8%를 태우고 있다.
소각장 가운데 한 곳은 2017년 용량 범위를 초과한 1만 3000톤의 폐기물을 소각하다 검찰 조사와 환경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주민들은 지역 내 암 발병률과 신체 내 카드뮴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지자체 차원의 조치를 요구했다. 현재 환경부 차원에서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한 1차 건강영향평가에 이어 장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건강 관련 우려가 큰 소각장이지만 북이면 3개소 모두 용량이 작아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없이 설립됐다. 전문가들이 '누적 조사' 등 주민 입장에서의 실질적인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후 조치를 요구하는 이유다.
최 소장은 "환경영향평가가 실질화하려면 사전에 약속한 여러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사후에라도 사업을 취소하거나 원상복구 할 수 있는 강제적 조치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평가 통과한 소각장 유해물질 배출 등 허점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 회원들이 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 출범 기자회견에서 환경영향평가 국가공탁제 도입과 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허위'로 통과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관련 실무 전문가들이 상시 모니터링 등 '사후 평가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산하 서울연구원은 최근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항목·심의기준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대행사, 심의위원, 공무원 등 환경영향평가 실무자 대상으로 진행한 제도 개선 포럼·설문조사의 내용을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 도입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91명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6.8%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53.8%가 사후관리 강화 여부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는 강한 긍정 의사를 내비쳤다.
사후관리 방안으로는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 체계 강화'(1순위 31.9%, 1·2·3순위 78.0%), '사후관리 매뉴얼·체계 마련'(1순위 27.5%, 1·2·3순위 74.7%), '사후관리 불이행 시 규제 등 법제화 강화'(1순위 20.9%, 1·2·3순위 65.9%) 등이 제시됐다.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허위'로 이뤄진 뒤 사후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환경영향평가는 취지가 좋은 정책이지만 특정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할 때의 조건들이 사후에도 잘 지켜지는지 살피지 않는 탓에 제도 자체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봐도 좋다"며 "이 같은 문제 의식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건강환경영향평가 등 보완적 조치들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사업이 본 평가를 통과하기만 하면 그 이후에는 만사형통"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적으로 생긴 쓰레기 소각 시설이 사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예다.
쓰레기 소각장은 용량이 100톤을 초과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환경부의 2020년 조사에서 소각장, 제철 생산시설 가운데 13%가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다이옥신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톤 이상인 소각장도 상당수 포함됐다. 특히 전남의 한 소각장은 배출 허용 기준치를 90배나 초과하는 다이옥신을 배출하다 적발됐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용량이 100톤 이하인 경우 환경영향평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이 문제로 작용한 사례도 있다.
충북 청주시 북이면은 1999년 첫 소각장을 시작으로 2010년 세 번째 소각장이 가동되며 현재 인구가 4800여 명에 불과한 지역에서 전국 쓰레기 소각량(일 7970톤)의 6.8%를 태우고 있다.
소각장 가운데 한 곳은 2017년 용량 범위를 초과한 1만 3000톤의 폐기물을 소각하다 검찰 조사와 환경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주민들은 지역 내 암 발병률과 신체 내 카드뮴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지자체 차원의 조치를 요구했다. 현재 환경부 차원에서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한 1차 건강영향평가에 이어 장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건강 관련 우려가 큰 소각장이지만 북이면 3개소 모두 용량이 작아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없이 설립됐다. 전문가들이 '누적 조사' 등 주민 입장에서의 실질적인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후 조치를 요구하는 이유다.
최 소장은 "환경영향평가가 실질화하려면 사전에 약속한 여러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사후에라도 사업을 취소하거나 원상복구 할 수 있는 강제적 조치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