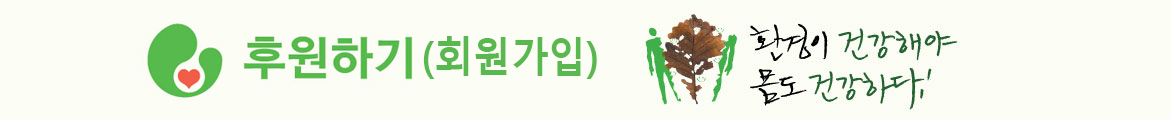[경향] 환경단체 “영풍석포제련소는 죽음의 공장, 정부가 폐쇄조치 나서야”
환경단체 “영풍석포제련소는 죽음의 공장, 정부가 폐쇄조치 나서야”
“제련소에서는 사람이 마시면 안 되는 수증기가 계속 나온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환경이다. 노동자들은 먹고살기 위해 죽음을 감수하고 일한다.”
경북 영풍석포제련소 노동자였던 진현철씨가 12일 영풍석포제련소 폐쇄 촉구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그는 2009년부터 그곳에서 일하다 2017년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당시 진씨가 착용한 유독 가스 보호장구는 천 마스크 한 장이 전부였다고 한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7년 이후 총 11명의 노동자가 이곳에서 사망했다. 죽음의 공장인 영풍석포제련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9일 영풍석포제련소에서 탱크의 모터교체 작업을 하다 1급 발암물질인 비소에 중독돼 60대 하청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병원에 입원했다. 숨진 노동자의 시신에서는 치사량의 6배가 넘는 비소가 나왔다.
진씨는 “공장 인근 산에서 나무가 고사하는 걸 자주 봤다.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냄새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사람도 많았다”며 “일하면서 점점 몸이 점점 무거워 병원에 가니 백혈병이라고 했다. 숨진 노동자의 소식을 접하고 ‘나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회사는 직업병이 아니라고 잡아뗐다. 행정법원에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회사로부터 연락 한 번 오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2일 진씨의 백혈병이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김수동 안동환경연합 대표는 “제련소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환경부가 제련소에 환경인증을 계속 내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제련소가 세간의 이목을 받지 않으니 근로환경 개선이나 법적 보완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제련소는 환경부의 개선명령에는 보여주기식으로 대응했으며, 오히려 새로운 공장까지 짓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석포제련소는 주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배를 불렸고, 정부가 그걸 인증해주는 역할을 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느냐”고 했다.
참가자들은 영풍석포제련소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공장 밖으로는 오염물질이 대기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산의 수목이 고사하고 낙동강을 따라 오염물질이 쌓이고 있다”고 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2021년 낙동강에 카드뮴을 불법 배출해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