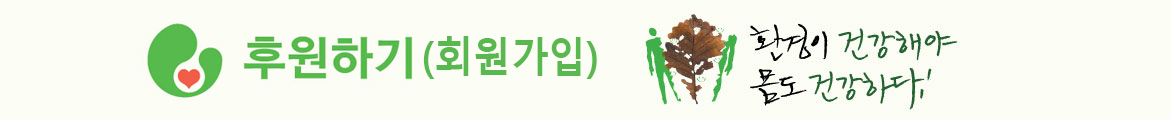[연합] 가습기살균제 사태 13년, 배상은 아직도…"일상 돌아가고파"
집계 사망자만 1천800여명…자식 잃고 이혼·일상 잃은 만성기침 등 사연
옥시·애경, 피해조정안 거부…"가해기업·정부, 배상·보상 적극 나서야"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벌써 13년이에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언제까지 그림자 속에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가습기살균제 피해 공론화 13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무실에서 만난 김태종(70)씨는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2011년 8월 31일 당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그해 4∼5월 임산부 또는 출산 직후 여성들에게 나타난 폐 손상 원인이 가습기살균제에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례는 전국 곳곳에서 신고됐고 지난달 31일 기준 총 7천956명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피해지원을 신청·접수했다.
31일 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파악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망자는 1천868명이다.
이 중에는 2020년 8월 10일 폐 섬유화로 숨진 김씨의 아내 박영숙 씨도 있다.
12년의 투병 끝에 숨진 박씨는 2007년 10월 이마트에서 '기획상품'이라며 단돈 990원에 판매하던 자체브랜드(PB) 상품 '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를 사서 썼다.
김씨는 평소 교회 성가대에서 활동할 정도로 폐활량이 뛰어났던 아내가 가습기살균제 사용 9개월 만에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고 회상했다.
"아내가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해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폐가 다 망가졌다. 여기 있어도 죽고 집에 가도 죽으니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더라고요. 2008년 7월부터 (아내가 숨진) 2020년까지 병원 중환자실에만 21번 입원했어요."
김씨는 "집사람이 아프면서 애들 교육도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고 함께 운영하던 학원도 접었다"며 "병원비는 입원할 때마다 2천만원씩 나오니 생활이 엉망진창이 됐다"고 돌아봤다.
2011년부터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과 정부에 사과 및 배·보상을 촉구해 온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도 "가습기살균제로 피해자 건강이 나빠진 것도 있지만, 그를 둘러싼 가족의 문제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도 않았다"며 사연을 보탰다.
가습기살균제로 어린 자식이 세상을 떠난 뒤 갈등을 빚다 이혼한 부부, 만성 기침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피해자 등 안타까운 사연은 헤아릴 수조차 없다. 최 소장은 "버젓이 광고되는 제품을 돈 주고 산 뒤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최소한의 배·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배상을 위해 싸우고 있다.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피해구제법)이 통과되면서 병원비·간병비·장례비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가해 기업으로부터 제대로 된 피해 배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는 2022년 최종 조정안을 내놨지만 가해 기업 중 옥시와 애경이 동의하지 않아 아직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피해구제법으로 일부 지원을 받았지만 병원에 쓴 돈의 50%가 채 안 돼요. 피해에 대한 배상은 전혀 받지 못했죠. 정부에서도 인정한 피해인데 가해 기업들은 분담금이 너무 크다며 조정안을 거부하고 있어요."
최 소장은 "13년이나 지났으니 사람들은 다 해결이 된 줄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가해 기업은 수백번이고 사과하며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정부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업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