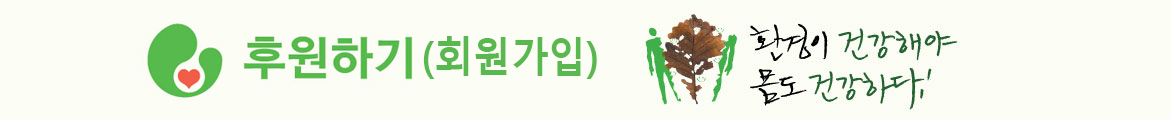"가습기살균제 형사처벌 왜 안되나 "
가습기살균제 형사처벌 왜 안되나
충청타임즈 2013 9 1 이재경 부국장<천안>
지난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어린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얼굴에 마스크를 쓴 어린이, 어른들의 모습이 보였고 거의 손에는 구호가 적힌 펼침막을 들고 있었다.
이날 모인 사람은 200여명. 모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이거나 그 유족들, 피해자 가족들이다. 이날 처음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회 및 추모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나왔다.
행사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헌화와 추도식, 성토대회 등 행사내내 절규와 오열이 끊이지 않았다. 무엇이, 왜 이들을 분노하게 했을까.
이들의 비극은 1994년 시작됐다. SK그룹 계열사인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세계 최초로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했다. 그해 11월 경제신문에서 이 뉴스를 보도했고 이듬해엔 광고와 함께 본격적으로 가습기살균제가 시판됐다. 당시 신문에 실린 광고 문구는 ‘내 아이를 위하여 가습기엔 꼭 가습기 메이트를 넣자구요’였다.
어린 자녀의 방에 겨울이면 무조건 틀어줘야 했던 가습기. 그 가습기에 살균까지 해 자녀의 건강을 챙기라는 홍보에 너도나도 살균제를 사서 투입했다.
그런데 그게 자살행위가 됐다. 살균제의 주성분인 PHMG, PGH, CMIT 등은 사람의 폐를 손상시키고 호흡 장애를 일으키는 치명적 독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 가습기살균제가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한 때는 1997년이다. 제품이 개발된 후 2년여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곧바로 시장에서 인기제품으로 떠올랐다. 가격도 몇천원 밖에 하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선 부담도 없었다. 연간 수십만개가 팔려나갔으며 제조·판매사 수만 20여개나 난립할 정도로 시장 경쟁도 치열했다.
그로부터 10여년 뒤인 2011년 봄 어느 날. 신문과 방송에서 임산부들의 의혹의 죽음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다수의 임산부가 서울의 한 병원에 폐질환으로 입원했다가 숨지거나 사경을 헤매게 됐는데 증세가 공교롭게도() 모두 비슷했다. 그해 5월, 총 8명의 환자 중 2명이 폐가 딱딱하게 굳는 폐섬유화 현상으로 사망했다. 뉴스가 괴담처럼 번지자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에 나섰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뒤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가 사람을 죽게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다.
피해자들은 경악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통합인증(KC) 마크까지 붙여준 제품이 살인무기였다니.
억울했지만 그래도 피해자들은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로 한 가닥 희망을 가졌다. 발표 전까지는 어디 하소연해볼 곳도 없었으나 이제 내 가족, 아들, 딸의 죽음의 이유, 현재 진행중인 고통의 이유가 명백해진 만큼 최소한 보상이나마 받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 때문이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이들은 그저께 다시 모여야 했다. 상황이 거의 변하지 않은 탓이다. 가해자인 대기업들은 보상은커녕 발뺌만 하고 대형 로펌을 고용해 소송으로 시간만 끌고 있다. 십수년간 갓난아기들, 산모들이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도록 방치한 정부 역시 뒷짐만 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늦게나마 피해자들의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결정한 것이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은 고통을 보상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피해자 가족들은 답답하다. 이게 왜 민사사건일까. 대기업이 치명적인 제품을 만들어 팔아 이득을 취했다. 죽은 사람이 127명이나 된다. 정부가 그걸 인정하고 발표했다. 총칼로 사람을 죽여야만 형사처벌을 받는 걸까.